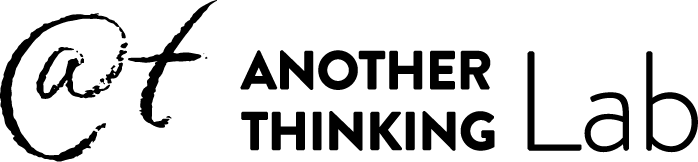얼마 전 뉴스를 통해 노르웨이 남성평등위원회가 정부에 "남자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1년 늦게 입학시키자"고 제안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노르웨이 남성평등위원회는 남아와 여아의 연령 별 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나중까지 이어지는 격차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이들이 '입학 유예'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별에 따른 발달 차이는 학교 적응력, 성적, 성취도 등의 차이로 이어지고 이 격차는 다시 양성 불평등과 갈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입학 유예 뿐만 아니라 교육 과정 등의 변화 등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남성 불평등'을 전제로 한 이런 주장에 대해 거센 비판은 물론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를 접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닌 '개인의 속도'에 따른 유연함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떠오른 게 독일 교육 시스템의 유급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발적 유급'이죠. 자발적 유급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한 학년을 다시 다니기로 결정하는 것으로, 아주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드문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독일학교 8학년인 우리집 아이는 같은 반 친구 중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섞여 있는데요, 두 명의 친구가 자발적 유급으로 학년을 낮춘 사례입니다. 물론 두 친구 모두 다른 학교(다른 나라의 독일학교)에서 전학을 오면서 학년을 낮춘 것으로, 같은 학교에서 같은 학년을 한 번 더 다니기로 한 경우와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아이의 반 친구들은 두 아이가 한 학년 높은 나이라는 점에 대해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독일 교육에서는 성적 등 기준이 충족할 경우 한 학년을 건너 뛰는 '월반'도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한 학년을 다시 다니는 것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