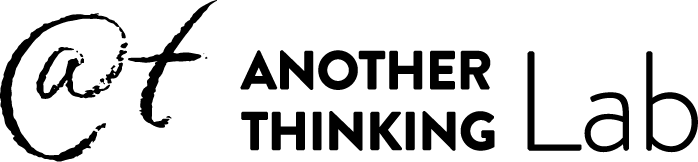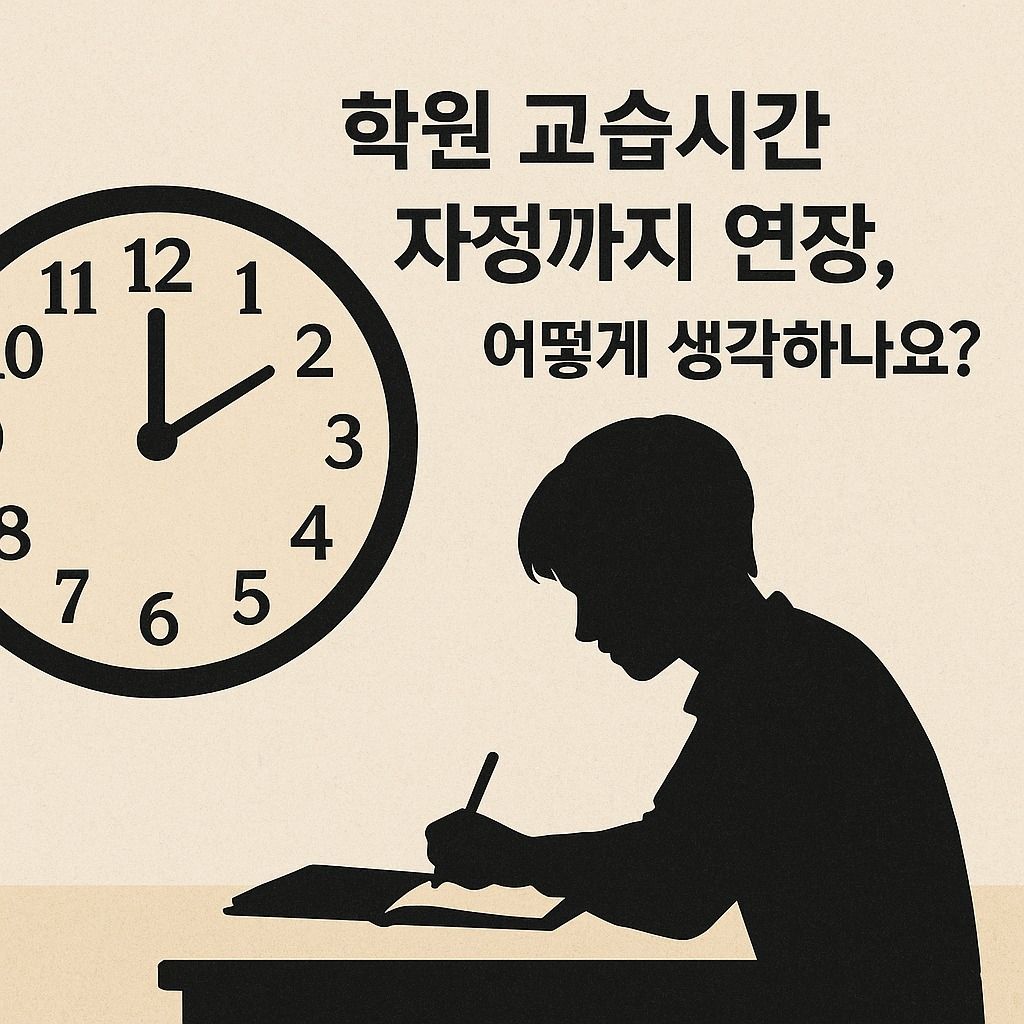우연히 TV 프로그램인 '유퀴즈'에 배우 김혜자 님이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에 다 인생의 지혜와 깊이가 녹아 있었지만 가장 묵직하게 다가온 멘트는 '나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슬픔은 아니지만 뭔가 슬프다고, 어떤 때 새벽에 일찍 눈을 떠 뿌연 창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이런 거를 못 보고 떠나겠지'라는 느닷없이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덤덤하게 말하던 장면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직 그 나이대가 느낄 만한 '나이'에 대한 감정을 저 같은 40대는 짐작도 못하겠지만, '뭔가 슬프다'고 그저 추상적인 슬픔을 내뱉었을 때 저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부터 해가 바뀔 때마다 혹은 생신을 맞이할 때마다 '나이 먹는 게 지겹다'고 습관처럼 말씀하시는 엄마와 건강이 좋지 않을 때마다 '내가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느냐'는 말을 달고 살던 아빠의 모습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실은, 아직 젊은 저는 그 말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았습니다. 나이 듦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생각을 한 때문이기도 하고, '요즘 같은 장수 시대에 숫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반박하며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나이 듦을 괜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