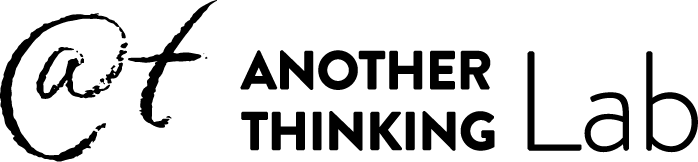대학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인들의 SNS에는 연일 'D-며칠'로 표시된 긴장감 가득한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시험을 치르는 당사자 만큼이나 부모님들의 속이 타 들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일생 일대의 시험을 앞두고 하루 하루 피 말리듯 전쟁을 치르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안쓰러운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 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12년 동안 해온 공부의 '결승선' 같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동안 아무리 잘해왔어도 그 날 하루에 따라 수험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참 가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읽은 <최재천의 공부>에서 최재천 교수님 또한 같은 내용을 지적하셨는데요, 대학 입시에 두 번 떨어졌던 본인의 경험담으로 시작합니다.
"'몇 년을 준비하고 재수까지 했는데, 왜 단 하루 만에 치른 시험으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지어질까? 이 시험을 1년 내내 펼쳐서 하면 어떨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평가가 달라지면 된다'였습니다."
서울대 교수 시절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저는 저 문장을 읽으며 독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할 수 있는 '아비투어(Abitur)'를 떠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