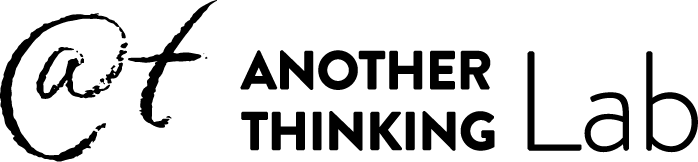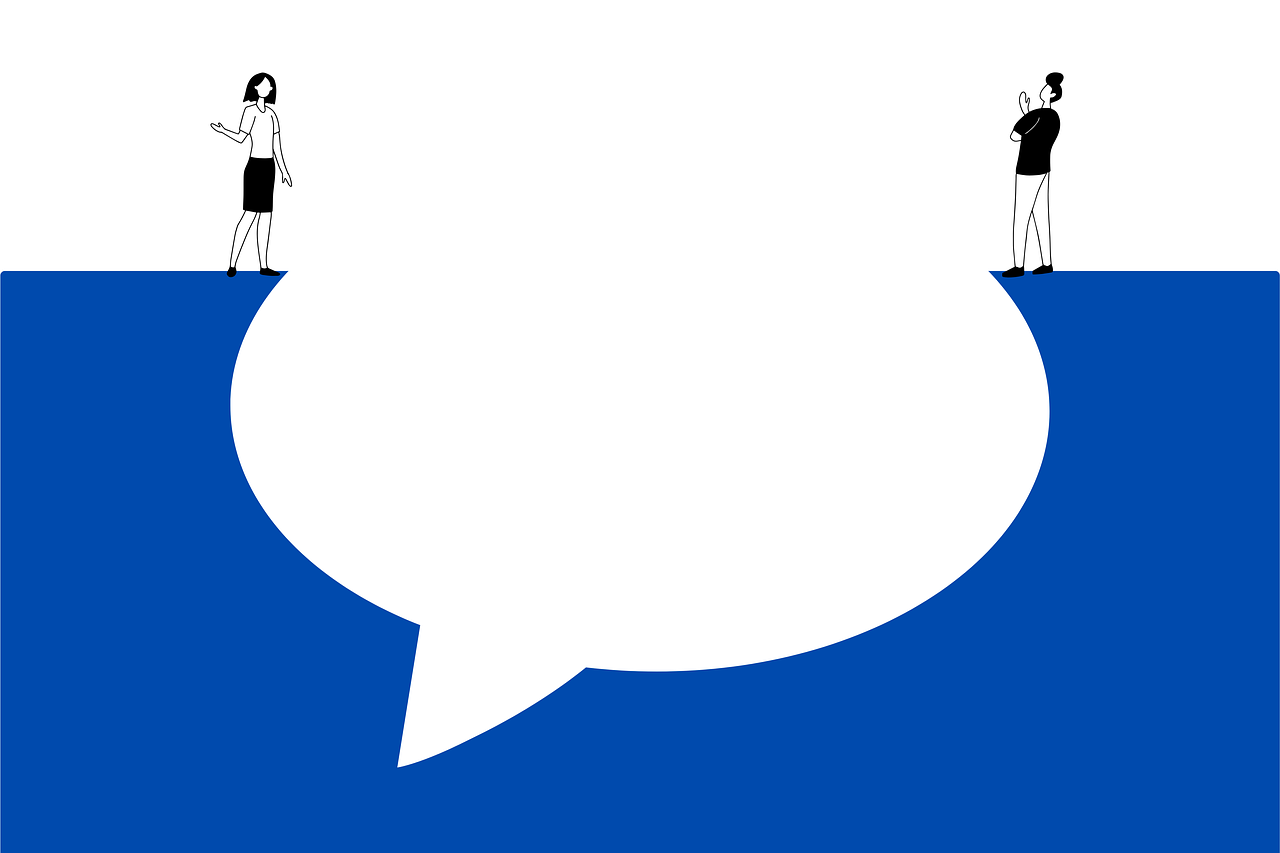"도시는 큰 공원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공원들로 깨어난다."
가든디자이너이자 작가인 오경아 선생님이 어떤 칼럼에서 한 말입니다. 방송작가 출신인 오 선생님은 서른 아홉이라는 늦은 나이에 가드닝 공부를 위해 영국으로 떠났는데요, 유학 당시 유럽 도시 곳곳의 공원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있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해당 문장의 앞뒤 배경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칼럼을 읽었던 당시, 독일 베를린에서 살던 경험을 떠올리며 속으로 '맞아 맞아'를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베를린은 도시 자체가 대규모 녹지 공간을 품고 있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동네 곳곳에 작은 공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디에 살든 대부분 근처에 공원 하나 쯤은 있기 마련이라 사실상 '숲세권'의 의미가 없는데요, 그 작은 공원들이야말로 일상에 활력을 주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죠. 현재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멀리 있는 큰 공원은 어쩌다 마음 먹고 가는 곳일 뿐, 늘 함께 하는 건 집 주변의 작고 작은 공원들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는 걸어서 15분 거리에 큰 규모의 공원이 있고, 10분만 걸어가도 중간 규모는 되는 역사 공원도 있어요. 거처를 정할 때 그 공원들이 장점이 되었던 건 분명한데 실제로는 바로 집 앞에 있는 아주 작은 '소공원'이 가장 소중한 곳입니다. 늘 오가는 동선 안에 지극히 일상적 공간으로 자리할 때 숲은 공원은 진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