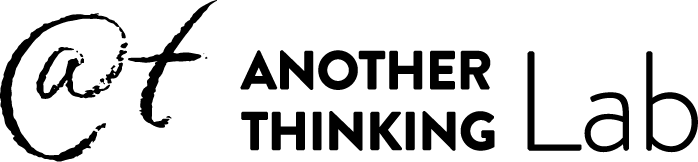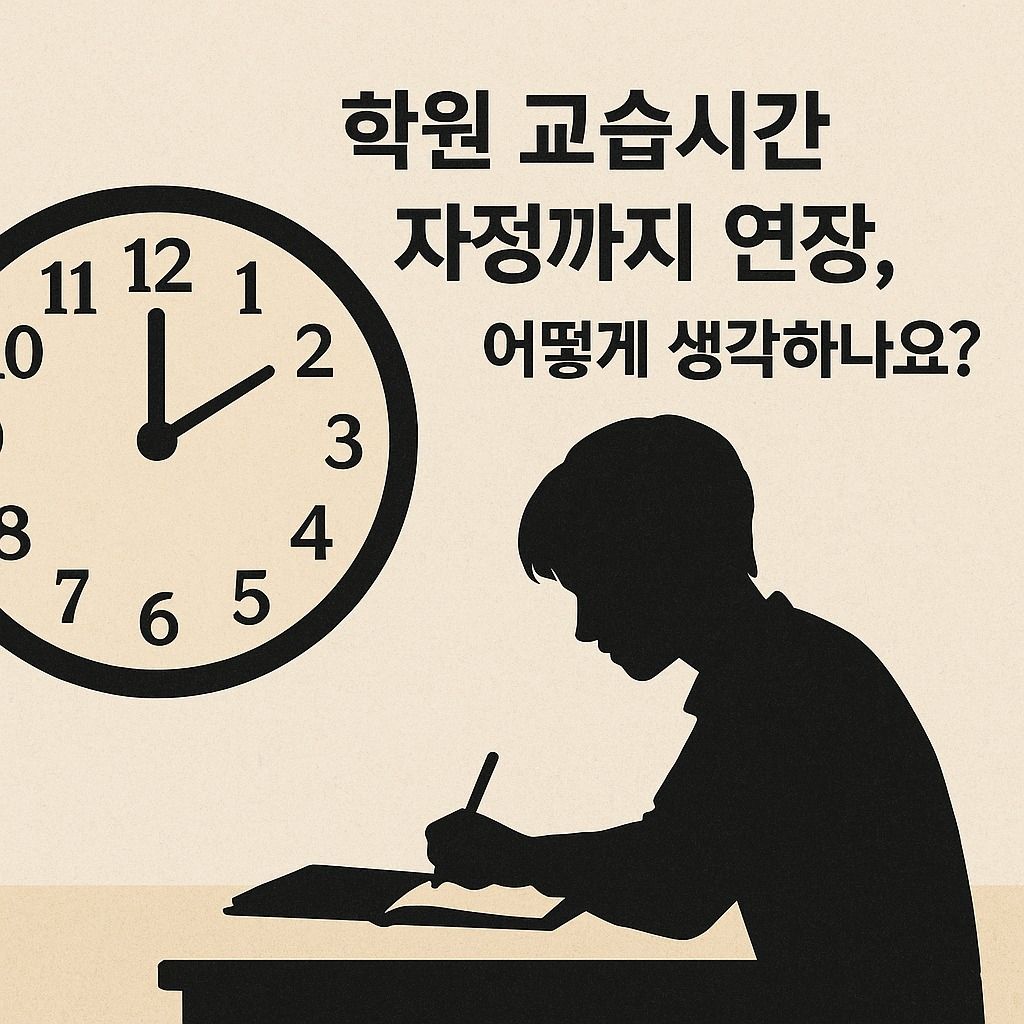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지난해 8월, "토론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내걸고 '어나더씽킹랩'을 오픈했습니다. 대학 졸업 직후부터 20년이 훌쩍 넘도록 항상 큰 조직에 몸을 담고 살았던 저는 비로소 내가 꿈꿔왔던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부풀었지만, 한 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회사 밖은 추워도 너무 춥다'고 말하던, 일찌감치 조직으로부터 독립해 자신의 길을 간 선배들의 조언도 생각나면서 과연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잘 버텨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때 저를 격려해준 가족과 친구들의 힘도 물론 보탬이 되긴 했지만, 결국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것은 '일단 시작해야 뭐라도 된다', '잘 안 되더라도 분명 남는 게 있을 것'이라는 내 안의 목소리였습니다. 기대만큼 잘 굴러가지 않더라도, 성장하지 못하더라도, 이익은커녕 투자만 하다 끝나더라도 내가 노력하는 만큼 결과물을 남길 테고, 그만큼 나는 또 성장하게 될 것이란 믿음도 어디선가 생겨났고요.
그러나 용기백배하고 시작한 사이트 운영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초반에는 구독은커녕 방문자 수도 극히 미미했고, 늘어나는 속도도 한없이 더디기만 해서,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얻는 아웃풋은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가 오래 지속됐습니다. 일주일에 상당 시간을 아이디어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컨텐츠를 만드는 데 들이는데도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지친 마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만 한 것일까, 오래 공부해서 좋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데 왜 알아주는 이가 이렇게 없는 것인가... 어느 날, 구독자 한 명만 늘어나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며 희망에 부풀고, 이후 한 동안 또 같은 상태가 유지되면 절망감에 싸이는 패턴이 오래 지속됐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