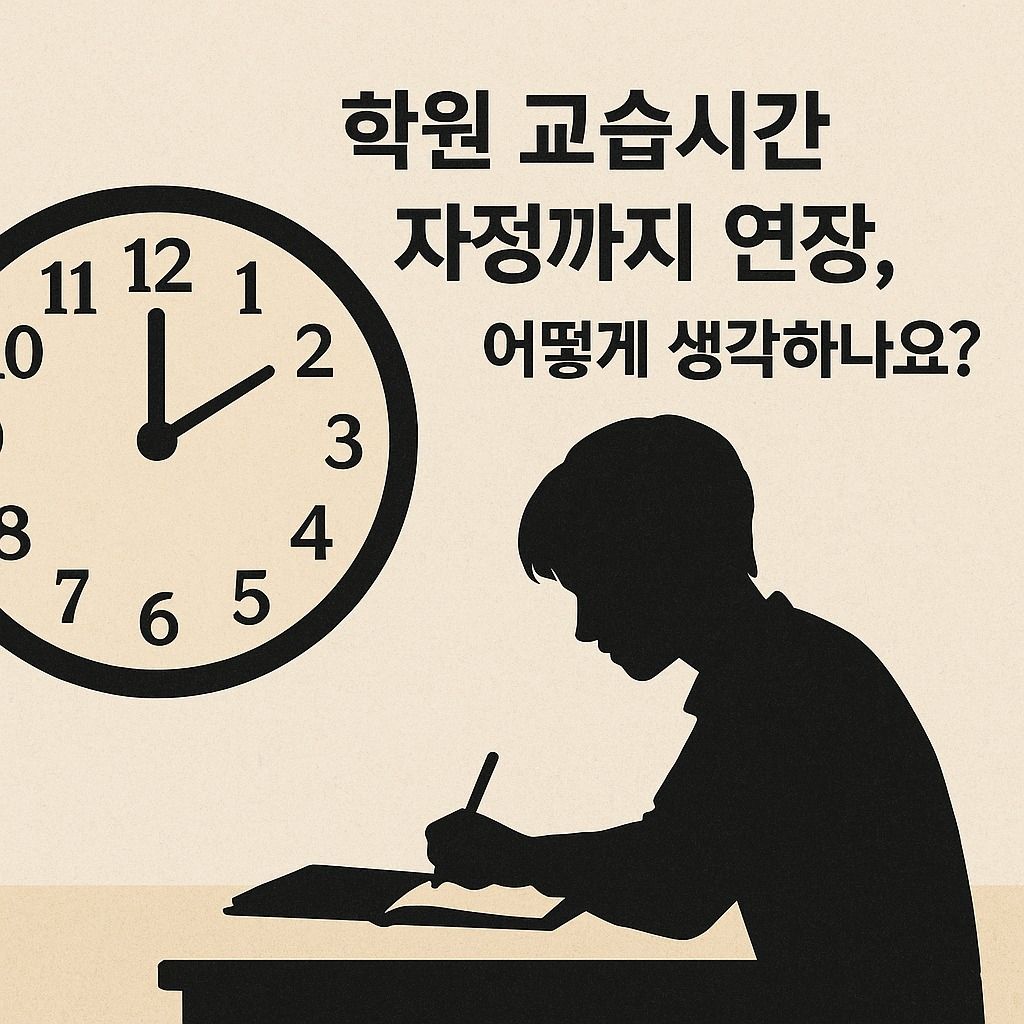요즘 뉴스에서 '전'이 이슈입니다. 얼마 전 성균관(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차례상 간소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음식 가짓수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안에 따르면 간소화한 추석 차례상의 기본 음식은 송편, 나물, 구이, 김치, 과일, 술 등 6가지이고 여기에 육류, 생선, 떡 등을 추가해 9가지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에 관한 것입니다. 성균관 측은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는 문헌을 근거로 들면서 '전을 부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름진 음식에 대한 기록은 사계 김장생 선생의 <사계전서> 제41권 의례문해에 나오는데,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라고 했다고 성균관 측은 전했습니다. 또 그간 차례상을 바르게 차리는 예법처럼 여겨왔던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조율이시(棗栗梨枾·대추·밤·배·감)'는 예법 관련 옛 문헌에는 없는 표현으로, 상을 차릴 때 음식을 편하게 놓으면 된다고 했고요.**)
이 발표 후에 관심은 온통 '전'에 쏠렸습니다. 뉴스 댓글에 보면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것인가"라는 식이 압도적이더군요.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그 문헌이 갑자기 나타났거나 새롭게 해석되었을 리 없고, 차례상 혹은 제사상에 전을 올려온 게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건만 갑자기 '전을 안 부쳐도 된다'고 말하면 모두가 '아 그렇구나,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할 것도 아니지 않나요.
어떤 기사에 보니 성균관의 발표를 보고 <이번 추석에는 "우리 이젠 전 부치지 말자"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늘어날 것 같다>라고 썼던데, 음 글쎄요. 반대로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이제 우리 전 부치지 말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며느리는 또 얼마나 될까요. 사실 성균관의 '표준안'에 따라 차례나 제사를 차리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각자 자신의 상황과 형편, 때론 '산 사람의 입맛'에 맞게 하고 있는 집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역시 결혼 해 차례와 제사를 지낸 지 13년이 됐지만 시댁의 제사상이 '표준안'에 따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